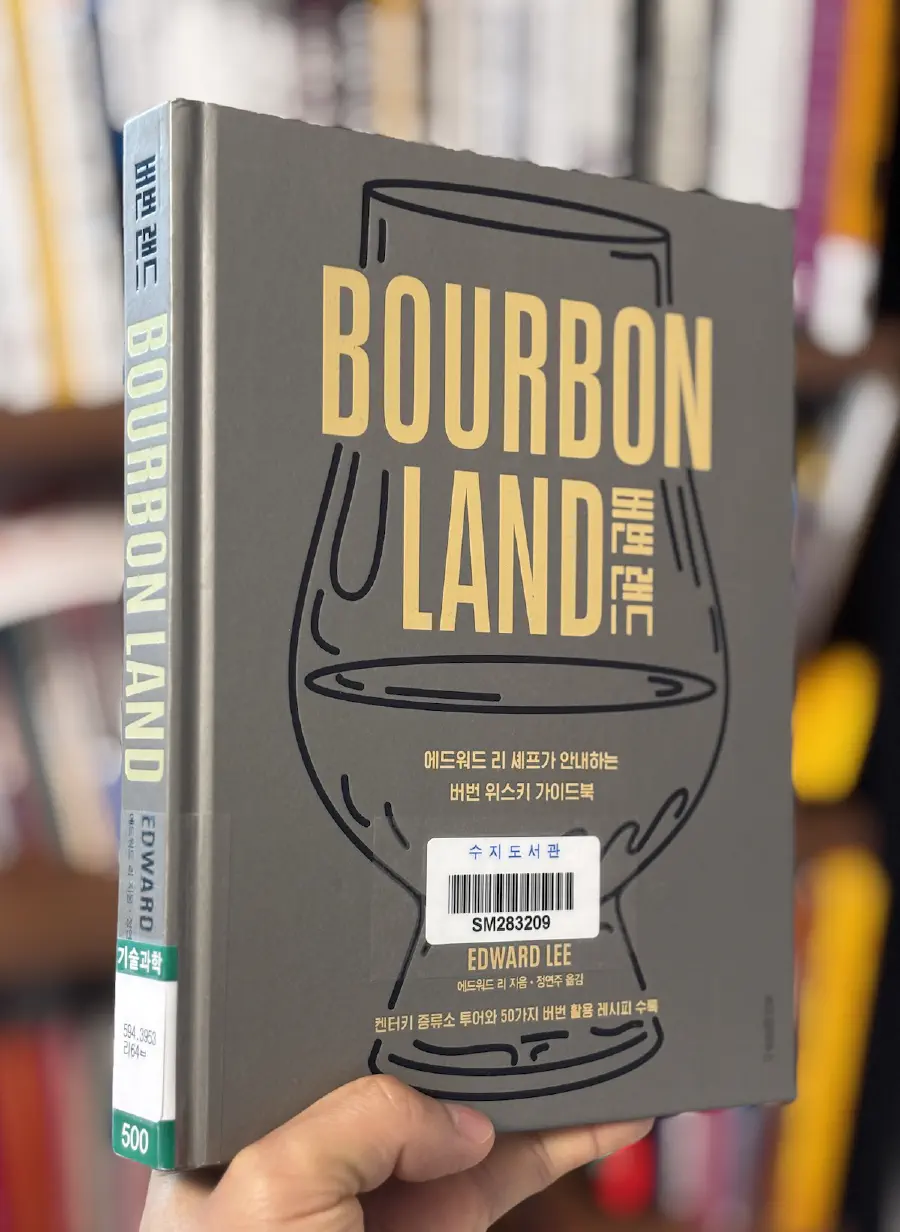흑백요리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균, 에드워드 리 셰프의 버번 위스키 가이드 북.
그가 켄터키에 자리를 잡은 이유 중 하나가 버번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위스키 애정이 듬뿍 묻어난 책이다. 대중에게는 흑백요리사의 준우승자로 더 익숙하지만, 이 책에서는 쇼의 얼굴보다 켄터키에 살고 있는 푸근한 셰프의 모습이 먼저 보인다.
좋은 잔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잔이 가장 좋고, 좋은 보틀은 쟁여두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니,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진다.
버번 위스키 입문서? 요리책?
버번 가이드북이라면 이미 조승원 작가의 ‘버번 위스키의 모든 것’ 을 읽는게 국내 독자들에겐 훨씬 편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 책은 번역서이고, 최초의 대상 독자가 미국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가이드북을 넘어서, 버번 위스키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가 가득 담겨있다. 대부분 위스키를 졸여낸 소스를 첨가하거나 조리 중에 넣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버번 위스키만이 가질 수 있는 향취를 입혀내려고 노력한 셰프의 노력이 돋보인다. 물론 음식도 전부 맛있어 보이고!
보다 따뜻한 안내서
전문분야에 대한 소개서를 쓸 때는, 소위 ‘아는 체’ 하기 쉽다. 그러면 용어는 점점 어려워지고, 문체는 딱딱해져서 읽는 사람을 밀어내기도 한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도, 그런 류의 어려운 책이 아닌가 오해하게 만들었다. 두꺼운 양장본에, 펼쳐보면 깨알같은 글씨가 즐비했으니까.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셰프의 위트가 곳곳에 터져나와 술술 읽혔다. 그리고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들! 음식 사진은 어찌나 때깔이 좋은지… 몇 장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찬장 속 글랜캐런 잔을 찾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결국 『버번 랜드』 는 어떤 버번을 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어떤 태도로 버번을 마시면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좋은 술은 쟁여두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과 나누는 계기라는 메시지가 조용히 남는다.
버번 위스키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그리고 술이 삶에 스며드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다.